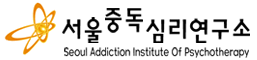[보도자료] "국내선 치료받는 성중독자 극소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구소 작성일12-08-31 16:38 조회2,14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국내선 치료받는 성중독자 극소수" - 성중독 심리 연구소 김형근 소장 인터뷰
입력 2011.07.15 11:45:59
2010년 한국에서 처음으로 성중독심리연구소를 개소, 성중독자 갱생모임을 운영하고 있는 김형근 소장은 중독자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독이 시작되는 심리적인 패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람은 기본적으로 왜곡된 신념, 마음의 태도라고 부르는 나에 대한 기본 정의가 존재하고 그 생각을 확인받으려는 심리적인 매커니즘이 있다" 며 "기본적으로 성중독자들은 자기에 대해 심하게 표현하면 "쓰레기 같다"는 자기 혐오에 기반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자신의 인식과 일치하고 자신의 생각이 맞다는 것을 확인 받기 위해 비난받을 행동을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반 상식 수준에서는 얼핏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생각이 맞다는 것을 확인 받기 위한 무의식적 작업"이라고 한다.
김 소장은 "이런 행위가 반복되면서 중독에 빠진 대상을 통해 자신을 위로할 수 있다고 믿었던 순간이 끝나고 나면 더 심한 자책과 죄책감이 찾아온다" 며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커지는 자괴감이 감당할 수 없어 결국 자살로 삶을 마감한다"고 설명했다. 중독자들이 무엇보다 도움이 필요한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인터넷에는 특히 청소년 층에서 자신이 음란물 중독, 또는 성중독인 것 같다며 고민을 호소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정보로 연계되는 것은 극히 소수에 불과, 거의 치료책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상황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각박한 세상에서 저마다 그 위로의 대상은 존재하기 마련"이라며 "사회가 성숙할수록 중독자에 대한 인식도 의지가 없는 구제불능의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 있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 인식의 전환을 강조했다.
하지만 자신의 자제력이나 도덕성의 문란을 성중독이라는 이름을 빌려 잘못을 희석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자신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미국 연방 하원의원 앤서니 위너는 "나는 성중독자"라고 주장하며 성중독을 면죄부로 이용하려 한 적이있다. 김소장은 치료와 죄값에 대한 이분법적인 생각이 필요하다며 저지른 잘못이 환자라는 이유만으로 면죄가 가능하다는 뜻은 절대 아니라고 부연했다.
김미리기자 mirkim@monews.co.kr
입력 2011.07.15 11:45:59
2010년 한국에서 처음으로 성중독심리연구소를 개소, 성중독자 갱생모임을 운영하고 있는 김형근 소장은 중독자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독이 시작되는 심리적인 패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람은 기본적으로 왜곡된 신념, 마음의 태도라고 부르는 나에 대한 기본 정의가 존재하고 그 생각을 확인받으려는 심리적인 매커니즘이 있다" 며 "기본적으로 성중독자들은 자기에 대해 심하게 표현하면 "쓰레기 같다"는 자기 혐오에 기반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자신의 인식과 일치하고 자신의 생각이 맞다는 것을 확인 받기 위해 비난받을 행동을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반 상식 수준에서는 얼핏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생각이 맞다는 것을 확인 받기 위한 무의식적 작업"이라고 한다.
김 소장은 "이런 행위가 반복되면서 중독에 빠진 대상을 통해 자신을 위로할 수 있다고 믿었던 순간이 끝나고 나면 더 심한 자책과 죄책감이 찾아온다" 며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커지는 자괴감이 감당할 수 없어 결국 자살로 삶을 마감한다"고 설명했다. 중독자들이 무엇보다 도움이 필요한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인터넷에는 특히 청소년 층에서 자신이 음란물 중독, 또는 성중독인 것 같다며 고민을 호소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정보로 연계되는 것은 극히 소수에 불과, 거의 치료책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상황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각박한 세상에서 저마다 그 위로의 대상은 존재하기 마련"이라며 "사회가 성숙할수록 중독자에 대한 인식도 의지가 없는 구제불능의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 있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 인식의 전환을 강조했다.
하지만 자신의 자제력이나 도덕성의 문란을 성중독이라는 이름을 빌려 잘못을 희석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자신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미국 연방 하원의원 앤서니 위너는 "나는 성중독자"라고 주장하며 성중독을 면죄부로 이용하려 한 적이있다. 김소장은 치료와 죄값에 대한 이분법적인 생각이 필요하다며 저지른 잘못이 환자라는 이유만으로 면죄가 가능하다는 뜻은 절대 아니라고 부연했다.
김미리기자 mirkim@mo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